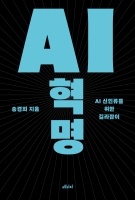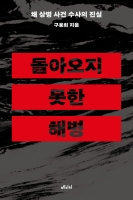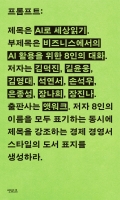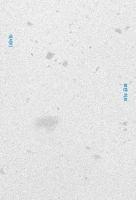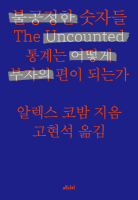윤 과장
뭔가를 출력하려 출력소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딸랑, 딸랑. 한 여학생이 책자 두 권을 들고 들어왔다.
“아…, 저 이거 여기서 출력한 건데, 학교에서 한 거랑 색이 너무 달라서요.”
나는 손님답게 컴퓨터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고, 실장이 응대했다.
“음… 난 이쪽 일은 잘 모르니까 우리 과장님한테 물어볼게. 윤 과장, 여기 나와서 이거 좀 함 봐 줘.”
“잠깐만요.”
학생은 윤 과장이 대답한 쪽을 슬쩍 봤다. 윤 과장은 나오지 않았다. 한참 지났다고 느꼈을 때, 실장은 윤 과장을 다시 불렀고, 그제야 나왔다. 윤 과장은 10년 전 내가 학생이었을 때도 여기서 일했다. 졸업하고도 가끔 출력할 일이 있을 때마다 들렀는데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목소리는 들렸다. 무뚝뚝하게 누군가와 통화하거나 뭔가 물어보면 짧게 그렇다, 아니다로 대답하는 소리였다. 의자와 책상 사이에 낀 채 눈과 입, 손만 살아 움직이는 몸집 큰 생명체 같다는 생각을 했다. 언젠가 실장은 그래도 걔가 인간적인 면이 있다고 했다.
윤 과장은 컴퓨터로 작업한 화면과 두 책자를 번갈아 보고는 밀려드는 화를 저지하는 듯 급하게 말했다. 말이 밀려 나오다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. 학생은 처음에는 윤 과장의 덩치에 흠칫했다가 자신이 받아칠 수 없을 만큼의 속도와 강도로 날아오는 말에 당황하는 것 같았다.
“출력물이, 아니, 우리 여기도, 보시면, 출력기가 네 대나 있지만 네 대 다 다르게 나와요. 종이에 따라서도 다르고. 이 종이는 얇고, 이 종이는 도톰하고. 그럼, 다른 프린터기에, 다른 종이로 뽑아봐 드릴게요. 그러고 나서도 다르면 저희도 어쩔 수가 없어요.”
학생은 겨우 “네”라는 대답만 하고 다시 기다렸다. 윤 과장 말의 불퉁스러운 기운이 공기 중에 맴돌았다. 새로 출력한 것이 나왔지만 어느 쪽과도 비슷하지 않았다.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됐다. 나는 학생이 가져온 책자를 봤다. 바닷물결을 찍은 사진이었다. 두 책자를 나란히 두고 비교해보니 파란색이 달랐다. 실장은 이건 퍼랗고, 이건 시퍼렇다고 했다. 윤 과장은 이게 화면하고 비슷하고, 이건 좀 비현실적으로 파랗다고 했다. 내가 보기에 이쪽 바다는 미지근할 것 같고, 이쪽 바다는 눈이 시릴 정도로 차가울 것 같았다. 학생은 시퍼렇고 비현실적으로 파란 쪽이 마음에 드는 기색이었으나, 더는 요구하지 못 하고 받아들였다. 학생이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돌아가고, 나와 실장과 윤 과장은 방금 일의 여운 속에 남아 떨떠름하게 있었다. 그러다 갑자기 윤 과장이 이제 속 시원히 말해야겠다며 열을 냈다. 나는 그런 윤 과장의 모습이 새로워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웃었다.
“아니, 누가 봐도 화면하고 비슷한 건 우리가 출력한 쪽인데, 시퍼런 거 가지고 와서 똑같이 해달라고 하면 어떡해, 바빠 죽겠는데. 내가 화면 보고 말이 탁 막히더라니까. 화가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걸 참았어요, 제가.”
실장은 웃으며 그래도 저 학생이 착하다고 했다.